
이제는 모든 행동을 할 때 흔적이 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형스타로 발돋움하던 연예인이 뒤늦게 과거의 흔적 때문에 성공의 목전에서 꿈을 접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치명적이지 않은 사안으로도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여자 아이돌 가수가 연습생 시절 연하의 남자 아이돌을 만났던 사진이 돌면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20대 중반이었을 때 열아홉 살에 불과한 남자를 사귀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트렌디 드라마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자 탤런트는 여럿이 팬티만 입고 찍은 사진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예전에 이미 나온 사진인데 인기가 높아지자 또다시 그 사진이 돌고 있는 것이다. 한 혼성그룹은 멤버 중 일부가 고등학교 시절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 떠돌면서 제대로 활동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꼭 연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지인 중 한 사람은 딸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바람에 권위를 세우기가 힘들어졌다. 친구의 “소주 한잔하자”는 글에 “좋아 좋아”라고 했는데 딸이 그걸 보고 “아빠, 왜 술을 마셔요”라고 항의한 것이다. 딸에게 늘 “교회 잘 나가라”고 당부했던 아빠의 체면이 구겨졌으니 이제 어떤 훈계를 하겠는가.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과 사진으로 혼외정사 사실을 밝혀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이런 사건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 조심하면 된다지만 친구 범위를 넓히다보면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일이 갑자기 터질지도 모른다. 지워도 지워도 사이버세상은 금방 복제가 되니 그저 흔적을 남길 때 유의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흔적을 지우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진원지 몇 군데에 찾아가서 발본색원하면 대충 처리가 됐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이다. 요즘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임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두 번 놀란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가’에 놀라고 ‘왜 그렇게 빨리 그만두고 나가나’ 하는 점에 놀란다. 하긴 인터넷에 비리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확대 재생산 된 소문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니 잘못했을 경우 빨리 항복하고 떠나는 게 상책인지도 모른다.
언론에서 종교비리 취재를 하는 것은 단지 ‘종교단체를 우습게봐서’만은 아니다. 유명사이트에 ‘제보 바란다’는 공지만 올리면 사진에다 동영상까지 마구 제공하니 진위 여부만 잘 가리면 프로그램 만드는 게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모 인터넷신문의 시민기자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비리를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도했다. 필자와 잘 아는 기자는 교회비리 기사를 쓴 이후, 이런 저런 자료제공과 기밀누설이 쏟아져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는 중이다.
한마디로 요즘 다들 유리감옥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사하면 다 나올’ 증거를 잔뜩 소유한 사람이 공직에 나서겠다는 용기(?)를 내기도 한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스스로 흔적을 양산한 땅투기 세력과 표절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논문 작성파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다. 유명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가 대놓고 시골의사 박경철 씨의 글을 베낀 일이 있었다. 박경철 씨가 공개적으로 그 건을 거론했을 때 그 소설가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렸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어 몇 가지만 치면 바로 소설가의 이름이 뜨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가수들은 신곡이 나올 때마다 표절 시비에 시달리고, 인기드라마 중에는 표절 판정을 받고 배상책임을 선고받은 일까지 있었다. 중앙 일간지에 당선된 신춘문예 작품이 표절로 밝혀지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사람들은 왜 흔적을 남기고 표절을 하는 것일까. 흔적을 남기는 일은 그야말로 둔감해서이고, 표절을 하는 쪽은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흔적이든 표절이든 어떤 일의 단서가 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본다면 둘 다 주의력 부족에 속한다. 둔감하든 비윤리적이든 산만해서든, 이젠 작은 꼬투리가 전체를 망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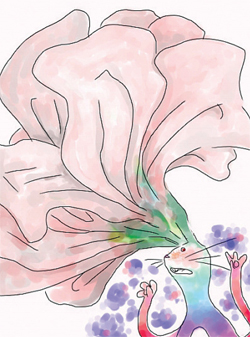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작은 빌미가 마치 핵분열을 하듯 순식간에 몸집을 불리는 괴력을 발휘한다. 하루 아침에 여론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순식간에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탈바꿈 시킨다. 좋은 빌미는 좋은 열매를 딸 수 있지만 자칫하다간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년 전 사망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50통의 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100회에 걸쳐 31명에게 성상납을 했다는데 그 중에 유력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필적은 맞는 걸로 나왔지만, 편지를 받았다는 A씨와 실제 편지를 주고 받았는지는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가 죽어도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법의곤충학자이자 프리랜서 과학수사가인 마르크 베네케가 쓴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책에는 다양한 살인사건과 그 사건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곤충들에 대한 흥미롭고 엽기적인 이야기, 유전자 감식을 둘러싼 사건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흔적을 통해 범인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사체 7,500구를 다룬 서울법의학연구소 한길로 박사 역시 현장에 나가면 ‘흔적’을 통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세상에서든 살인사건 현장에서든 흔적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당연히 범죄를 하지 않아야겠지만, 함부로 흔적을 남겨 대수롭지 않은 일로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현실 세상과 사이버 세상, 두 개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흔적 관리는 스펙 관리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종목이 되었다.ⓒ미래한국
본지 편집위원·소설가 www.rootlee.com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